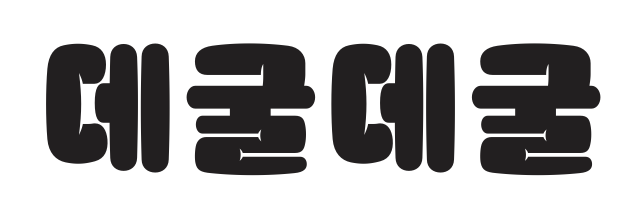나의 시간은
나의 하루는
하염없이 데굴데굴 잘도 굴러갑니다.
시간이 데굴데굴 굴러가는 건지
내가 데굴데굴 구르는 건지
가끔은 잡고도 싶고,
가끔은 빨리 보내고도 싶어요.
시간만큼 성실하지 못한 내가 한심해
재빠르게 굴러가는 남들 틈에 끼어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또 어때요.
데굴데굴 굴러가는 하루
모든 순간들이 반짝이지는 않아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찾는다면
데굴데굴
데굴데굴
나는 괜찮아요.
데굴데굴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을 찾아요.
‘죽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말이에요.
국내 최초 죽음 월간지
우리는 데굴데굴입니다.
일상의 반짝임, 그리고 죽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에 어리둥절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죽음과 거리가 멀다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데굴데굴 일상을 굴러다니다 보면
죽음은 어디에나 있어요.
삶이 있는 곳엔 늘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엔
언제나 삶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끝을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나요?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도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지금이 내 마지막 순간이라면
월간지 데굴데굴은
매월 ‘죽음’이라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무겁지만 귀중한 열쇠를 쥐고
데굴데굴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의 소중함을 찾아내길 바라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내길 바라고 또 바라요.